
눈송이가 소복하게 쌓여 눈길을 내고 눈덩이가 불어나 눈사람이 만들어지듯,
지금 우리의 모습에는 과거의 경험과 우연들이 녹아있다.
카자흐스탄에서 온 오늘의 주인공 쉬나르 역시 한글에 대한 작은 경험이
그를 한국으로 이끌었다. 세상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에 큰 매력을 느끼며,
여전히 한국과 ‘친해지고 있는 중’이라고 말하는 쉬나르를 만나보았다.
 ▲ 경복궁을 찾은 쉬나르
▲ 경복궁을 찾은 쉬나르
안녕하세요, 국립한글박물관 소식지 ‘한박웃음’ 독자 여러분. 저는 카자흐스탄 출신의 쉬나르입니다. 제가 한글을 배우게 된 것은 정말 우연한 기회에서 시작되었어요. 동양학과에 재학하던 시절에 아시아 국가의 언어 중 하나를 필수로 선택해서 배워야 했는데, K-POP 팬이었던 언니 덕에 어렴풋이 알고 있던 한국을 선택해 공부를 시작했답니다. 당시 저는 한글에 대해 무지했어요. 중국어나 일본어와 겨우 구분할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상태였죠. 아주 단순한 호감과 호기심이 저와 한글을 이어준 거예요.
저와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 대부분은 그 전부터 한류 문화를 접해왔었고 기초적인 내용을 미리 학습한 상태였던 반면, 저는 단순한 호감으로 이 수업을 선택한 것이다 보니 아무리 공부를 해도 하위권을 맴돌 뿐이었어요. 마치 토끼와 달리기 경주를 하던 토끼와 달리기 경주를 하던 거북이가 된 기분이었답니다. 하지만 끝까지 경주를 포기하지 않았던 거북이가 우승을 차지하듯, 저 역시 남들보다 세 배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 결국 상위권으로 그 수업을 수료할 수 있었어요.
사실 한글은 처음 배울 때 모국어와 다른 글자 모양이나 발음 등이 특히 어려웠어요. ‘오’나 ‘아’나 ‘어’가 저에게는 별 차이 없게 들렸거든요. 오히려 한국 분들이 어렵다고 하는 맞춤법이나 문법이 더 편하게 느껴졌어요. 지도 교수님께서 엄격한 분이시라 기초부터 탄탄하게 배웠거든요.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는 한글로 일기를 적기도 했어요. 활발한 성격이기는 하지만 깊숙한 내면의 이야기는 저 혼자 정리하는 편이거든요. 가족과 함께 살던 시기였기에 누가 봐도 읽을 수 없는 한글로 제 생각을 정리하곤 했죠. 부모님이 왜 한글로 일기를 쓰느냐고 질문한 적이 있는데, 빨리 배우고 싶다고 얼버무렸던 기억이 나네요. (웃음)
제가 3학년이 될 무렵, 지도 교수님께서 ‘지금껏 익힌 실력이 아깝다’고 하시면서 한국에서 공부를 더 해볼 것을 권유하셨고, 2018년 한양대학교에 진학하면서 이곳에 오게 되었어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가 아마 이맘때쯤이었을 거예요. 매우 습하고 더운 여름에 장마 기간이었던지라, 제 기대를 충족시키진 못했던 기억이 나요. (웃음) 서울은 크고 멋진 도시지만, 저를 외롭게 한 회색빛 도시이기도 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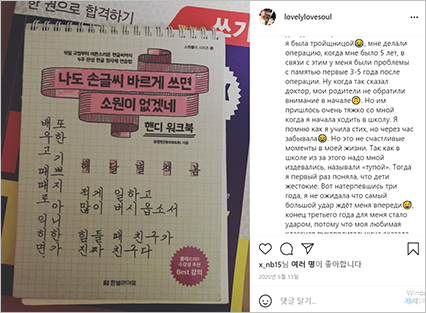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학교생활도 카자흐스탄과 많이 달랐고 한국 사람들도 조금 차갑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서 마음을 열기 시작하자 친구도 생겼고 한국 문화의 좋은 점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특히 카페에서 공부하고 일하는 것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도 ‘카공족’ 중 하나예요. 그렇지만 이런 줄임말이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리 달갑지 않아요. 뜻을 알고 나면 재미도 있고 공감도 가지만, 줄임말의 뜻을 알아보려고 검색을 했을 때 그 답이 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한국 친구에게 일일이 물어보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친구들과 소통하기 위해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생활한 덕분에 얼마 전부터 한국 기업에 취업해 일하게 되었답니다.
회사 분들은 저를 ‘쉬나르’라고 부르고, 친구들은 ‘나르’라고 해요. 처음에는 마치 별명처럼 들리고 놀리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저만의 애칭이라고 생각해요. 저를 지칭하는 이름들이 많을수록, 하나의 정체성에 얽매이지 않는 기분이 들어서 좋아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나갈 예정이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아주 먼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당장 해야 할 것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편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지내는 현재에 충실하되 내가 나아갈 방향이 어디인가를 계속해서 고민해보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