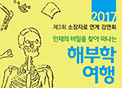잘 쓰려고 하면 잘 쓸 수 없다. ‘잘 쓰려고 한다.’는 것은 의욕이 앞서는 것이다. 물론, 의욕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방법이 더 중요하다. 방법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글을 잘 쓰는 사람에게 들을 수도 있고, 잘 쓴 글을 보면서 알 수도 있다. 다음은 내가 즐겨 쓰는 글쓰기 방법이다.
첫 번째 방법은
한글의 우수성에서 찾을 수 있다.
한글은 오묘하다.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문자 가운데 가장 많은 발음을 표기할 수 있다. 유의어도 많다. ‘발전’이란 단어의 유의어만 해도 발달, 진전, 진보, 융성, 흥성, 번영, 도약, 성장, 성숙, 신장, 약진, 향상 등 다양하다. 의성어, 의태어는 또 얼마나 많은가. 우리글은 깊고 넓은 표현이 가능하다. 글쓰기의 진정한 맛을 느끼기에 적합한 글이다.
 우수한 한글을 활용하여 글을 잘 쓸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다. 포털사이트 국어사전을 열어놓고 쓰는 것이다. 나는 한 장 정도의 글을 쓰면 3~5개 단어를 쳐본다. 단어 뜻을 몰라서가 아니다. 유의어 중에 더 적합한 단어는 없는지 찾아보기 위해서다.
우수한 한글을 활용하여 글을 잘 쓸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다. 포털사이트 국어사전을 열어놓고 쓰는 것이다. 나는 한 장 정도의 글을 쓰면 3~5개 단어를 쳐본다. 단어 뜻을 몰라서가 아니다. 유의어 중에 더 적합한 단어는 없는지 찾아보기 위해서다.
많은 사람이 처음 떠오르는 단어로 글을 쓴다. 그러면 잘 쓸 수 없다. 한정된 어휘 안에서만 글을 쓰기 때문이다. 어휘력이 늘지도 않는다. 평소 안 쓰는 단어를 찾아서 쓰는 버릇을 들여야 한다.
꼭 한번 시도해보라. 습관적으로 국어사전 검색창에 단어를 쳐보라. 안 쓰던 단어로 수정할 때 짜릿함을 느낀다. 안 쓰던 근육을 쓸 때 느끼는 기분 좋음이다. 마크 트웨인이 그랬다. “딱 맞는 단어와 적당히 맞는 단어는 번갯불과 반딧불의 차이다.”
두 번째 글쓰기 방법은
내 글을 읽는 독자에게서 찾을 수 있다.
글의 종류가 많다. 회사에서 쓰는 보고서, 제안서, 품의서, 기획안, 발표문, 홍보문과 학창시절 써야 하는 자기소개서, 과제 리포트, 그리고 서평, 기행문 등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독자가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내 글에서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 무엇을 줘야 독자가 만족할 것인지. 누군가 그랬다. “독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안다는 것은 글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아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이를 소홀히 한다. 무게중심이 읽는 사람이 아니라, 쓰는 사람에게 있다.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야겠다, 내가 글을 잘 쓰는 것처럼 보여야겠다.’라는 생각이 앞선다. 그러면 그럴수록 중언부언하게 되고, 불필요한 수식어와 수사법을 남발한다. 독자는 헷갈리고 화가 난다.
독자에게 필요한 것은 글이 자신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자신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가 하는 것이다. 모르던 것을 알게 해주는지, 새로운 관점과 해석을 제공해주는지, 통찰을 주는지, 감동을 주는지, 하다못해 웃음을 주는지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기소개서를 읽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연히 그려지면 합격이다. 제안서를 읽고 제안한 내용에 관해 확신이 들면 성공이다. 독자에게 주는 것이 없으면 백전백패다.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구어체로 쓰는 것이다. 그래야 읽는 사람이 말을 듣듯이 편하게 읽는다. 눈으로 읽는 것 같지만 독자는 스스로 소리 내 귀로 듣는다. 구어체로 쓰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만나 먼저 말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무슨 글을 써야 하는데, 주로 이런 내용이야” 이렇게 말하다 쓸거리가 정리될 뿐만 아니라 없던 생각도 새롭게 생겨난다. 그리고 말할 때 느낌이 글에서 살아난다. 구어체로 쓰게 되는 것이다.
글을 쓸 때도 독자를 앞에 앉혀놓고 써야 한다. 독자를 구체적으로 한 사람 정해놓고 쓰는 게 좋다. 연애편지 쓰는 것처럼. 그러면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며 쓸 수 있다. ‘아, 됐고 결론이 뭐야?’ 또는 ‘다짜고짜 무슨 말이야, 좀 찬찬히 설명해봐’ 뭐 이런 소리 말이다.
또한, 독자를 정해놓고 쓰면 진정성이 살아난다. 대상이 막연하지 않기 때문에 읽는 사람이 공감할 확률이 높아진다. 나를 위해 무언가를 전해주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느끼면서 고마워한다. 말을 심하게 더듬는 사람이 내게 무엇인가를 전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그런 진심이 전해지면 된다. 글을 유려하게 잘 쓰고 박식한 것보다 더 독자의 심금을 울린다. 글에도 표정과 느낌이 있다. 독자를 위하는 마음으로 쓰면 그 마음이 전해진다.
세 번째 글쓰기 방법은
퇴고에 있다.
 글을 잘 쓸 필요 없다. 잘 고쳐 쓰면 된다. 잘 고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 하나는 시간을 들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무엇이 틀렸는지 아는 것이다.
글을 잘 쓸 필요 없다. 잘 고쳐 쓰면 된다. 잘 고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 하나는 시간을 들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무엇이 틀렸는지 아는 것이다.
무엇이 틀렸는지 아는 방법이 있다. 온라인 서점에 가서 검색창에 ‘글쓰기’, ‘보고서’ 등을 쳐보라. 그러면 책의 목차에 ‘글은 이렇게 써라’, ‘이렇게는 쓰지 마라’ 등이 나온다. 이 가운데 나도 이렇게 쓰고 싶은 항목, 나도 저렇게는 안 써야겠다는 항목을 20~30개 추려 종이 한 장에 쓴다. 쓴 것을 책상에 붙여놓고 글을 쓰고 나면 여기에 부합하게 썼는지 하나씩 맞춰본다.
그러다 보면 아예 글을 쓰는 단계에서 여기에 맞춰 쓰게 된다. 그런 상태가 되면 체크 리스트 수준을 높여야 한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높여가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글쓰기 실력이 자란다. 체크 리스트가 헤밍웨이나 톨스토이 수준이 되면 그들처럼 쓰게 되는 것이다.
끝으로, 문장력, 구성능력 등을 키우는
글쓰기 팁이다.
문장력을 키우려면 명문장이나 마음에 드는 시구 20여 개를 암송해보라. 그 이전과 이후의 글쓰기 수준이 달라진다. 단, 글을 쓰고 싶어지는 단점(?)이 있다. 구성력을 향상시키려면 온라인 서점에 수시로 들어가 책 목차 보는 것을 즐겨보라. 목차에서 얻는 영감과 배경지식은 덤이다. 글을 습관적으로 쓰라.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에서 써보라. 쓰기 전에는 자신만의 의식을 치르라. 커피를 마시거나 산책을 하거나. 뇌는 이를 글 쓴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글 쓸 준비를 한다. 글 쓸 때 시간을 정해놓고 써보라. 3분 내에 쓰겠다, 5분 내에 쓰겠다고 정해놓고 시계를 계속 보면서 써보라, 뇌가 욕심은 내려놓고 직관을 동원한다. 단, 쓴 후에 시간을 들여 고쳐야 한다. 이 글이 그렇게 쓴 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