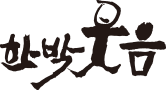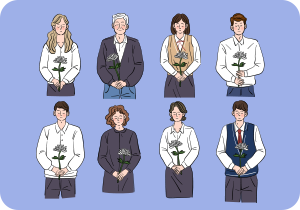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제주방언 살펴보기
제주방언에 폭싹 빠졌수다!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제주방언 살펴보기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는
제주도에서 태어난 주인공 ‘애순’과 ‘관식’의 일생을
사계절로 풀어내 많은 이의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며,
드라마 속 제주방언도 덩달아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번 호에서는 독특한 매력을 지닌 제주방언에 대해 알아보고,
그중에서도 ‘폭싹 속았수다’에 나왔던 방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방언, 그것이 알고 싶다!

타지 사람이 제주방언을 들으면 쉽게 이해하지 못해 고개를 갸웃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주방언이 이처럼 다른 지역의 방언과 큰 차이를 보이게 된 이유는 한반도와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입니다.
조선 인조 7년(1629년)에는 제주도민들이 제주 섬을 떠나는 것을 금지한 정책인 ‘출륙금지령’이 내려져 제주도민들은 관청의 허락 없이 다른 지역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200년 가까이 섬 안에 고립되어 폐쇄된 생활을 해야 했던 아픈 역사는 제주방언이 독자적으로 발달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제주방언에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있었던 ‘아래아(ㆍ)’와 ‘쌍아래아(‥)’ 등 한글의 일부 원형이 남아 있습니다.
대체로 단어의 첫 음절에 한해 실현되는 제주방언의 ‘아래아(ㆍ)’는, ‘혀의 앞뒤 위치’에서 ‘아’보다 더 뒤쪽에서 발음되고, ‘혀의 높이’에서 ‘오’와 ‘아’ 사이에서 발음되며, 입술을 어느 정도 둥글게 하면서 내는 모음입니다.
이런 제주방언의 ‘아래아(ㆍ)’는 중세국어 ‘아래아(ㆍ)’의 소리를 추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주방언에는 제주도의 역사와 생활을 담고 있는 특별한 어휘도 많습니다. ‘허벅(병 모양의 물동이)’, ‘테역(잔디)’, ‘비바리(처녀)’, ‘지슬(감자)’ 등은 제주방언에서만 나타나는 어휘입니다.
이 밖에도 다른 방언과 의미 영역이나 어원을 달리하는 단어 또는 몽골어 등의 외래어에서 유래한 독특한 어휘도 매우 많습니다.
‘폭싹 속았수다’ 속, 그때 그 제주방언!
 ▲ 출처: 넷플릭스
▲ 출처: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에는 이처럼 낯설고 독특한 매력을 지닌 제주방언이 여러 차례 등장해 극의 몰입감을 높였습니다.
드라마 제목인 ‘폭싹 속았수다’는 얼핏 보기에 무언가에 ‘완전히 속았다’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매우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뜻의 제주방언입니다.
이 드라마는 제주에서 태어난 요망진 반항아 애순이와 팔불출 무쇠 관식이의 모험 가득한 일생을 사계절로 풀어냈는데, 이때 애순이를 묘사한 ‘요망지다’가 ‘똑똑하다’를 뜻하는 제주어입니다.
애순의 엄마 광례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악착같이 물질을 하는 ‘잠녀’로, 무리하게 일을 하다가 결국 29세에 ‘숨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잠녀(ᄌᆞᆷ녀)’는 바닷속에 들어가 해삼, 전복 따위를 따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해녀’를 뜻하며, ‘숨병’은 ‘잠수병’을 뜻하는 제주방언입니다.
애순은 어린 나이에 엄마를 떠나보냈지만, 열 살 때부터 애순만을 바라본 관식의 지고지순한 사랑으로 험난한 세상을 헤쳐 나갈 힘을 얻습니다.
애순과 관식이 새로운 출발을 꿈꾸며 부산으로 도망칠 때, 배 안에서 선장님과 나눈 짧은 대화에서도 정겨운 제주방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선장이 애순과 관식을 보고 가출한 청소년이 아닌지 의심하자 애순은 “뭐랜 고람시니? 모르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표준어로 바꿔 말하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입니다.
신혼부부가 된 애순과 관식은 궁핍한 살림으로 먹고 살 걱정을 하고, 그들을 지켜보던 집주인 노부부는 몰래 애순과 관식을 도우며 따뜻한 이웃의 정을 보여줍니다.
이때 집주인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물꾸럭 퍼나른 하르방 누겐디?”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하르방’은 ‘할아버지’를 뜻하며, ‘물꾸럭’은 ‘문어(문게)’를 나타내는 제주방언입니다.
인생의 사계절을 담은 드라마답게 에피소드 소제목에도 계절의 특성을 잘 녹여냈습니다.
특히 ‘호로록 봄’, ‘꽈랑꽈랑 여름’, ‘자락자락 가을’, ‘펠롱펠롱 겨울’ 같이 제주방언 특유의 감각적인 의태어를 사용해 운율을 살린 모습이 눈에 띕니다.
‘꽈랑꽈랑’은 ‘불볕이 내리쬐는 모양’을 나타내며, ‘자락자락’은 ‘무엇이 매달려 있는 모양’, ‘펠롱펠롱’은 ‘빛이 잠깐잠깐 계속해서 비치는 모양’을 뜻합니다.
제주방언은 타국의 낯선 언어처럼 이국적으로 들리지만, 사실 섬에서 자신의 삶을 꿋꿋이 일궈 나간 강인한 제주인의 정체성과 삶을 담고 있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현재, 제주방언은 2010년 12월 유네스코에 의해 소멸 위기 다섯 단계 중 4단계인 ‘아주 심각하게 위기에 처한 언어’로 분류될 정도로 소멸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제주 사람들의 삶과 정서가 고스란히 묻어나 있는 제주방언은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 <사투리는 못 참지!> 전시 전경
▲ <사투리는 못 참지!> 전시 전경
아직 조금 기다리셔야 하지만, 올 가을 제주에서(9.22~12.7/제주 돌문화공원 설문대할망전시관) 지난해 국립한글박물관 개관 10주년을 맞아 방언을 주제로 열린 기획특별전 <사투리는 못 참지!>의 순회전시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 전시는 방언의 말맛과 다양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한자리에 모은 최초의 전시로, 방언의 색다른 매력을 알릴 뿐 아니라, 한글의 소중함도 일깨워 줍니다. 현장 조사를 통해 채집한 제주방언 자료들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 제주방언을 더 알아가고 싶은 분들께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