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말 캐내기
다가오는 가을을 맞이하며,열매 관련 풍성한 우리말 알아보기!
우리말 캐내기
다가오는 가을을 맞이하며,
열매 관련 풍성한 우리말 알아보기!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요즘,
길고 뜨거웠던 여름은 지나가고
가을이 어느새 성큼 다가온 듯합니다.
곡식과 열매가 익어가는 풍요의 계절 가을을 반갑게 맞이하며,
이번 호에서는 열매와 관련된 우리말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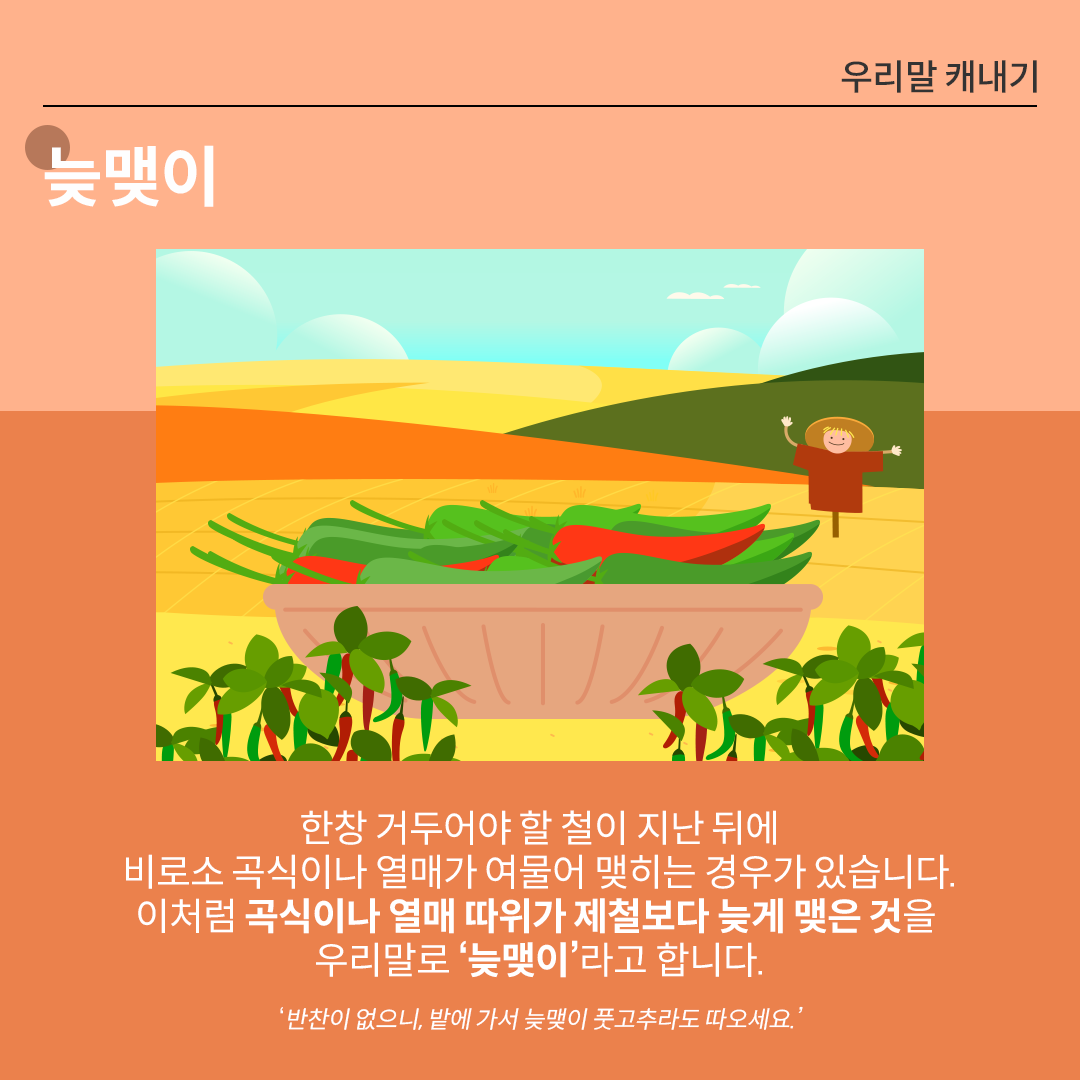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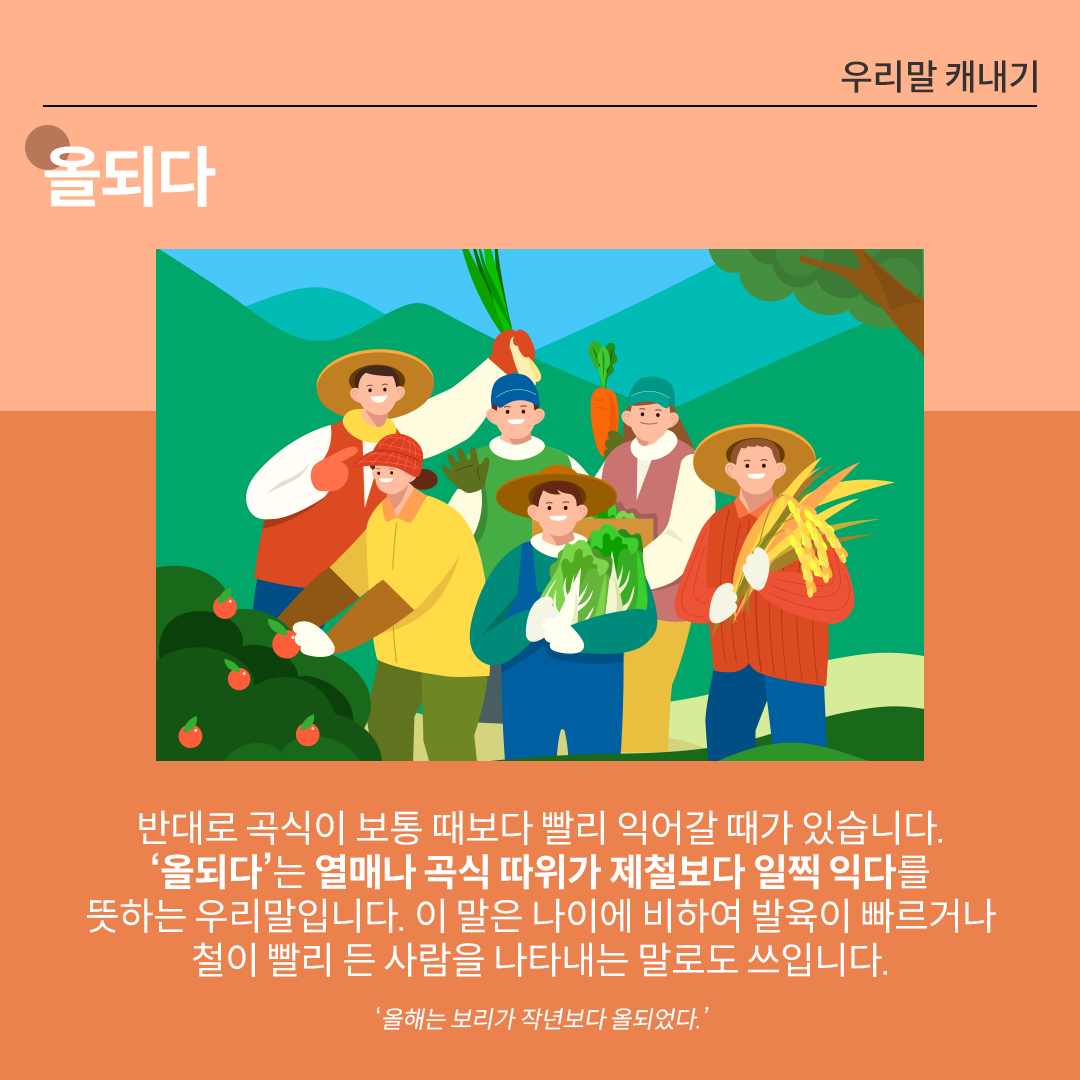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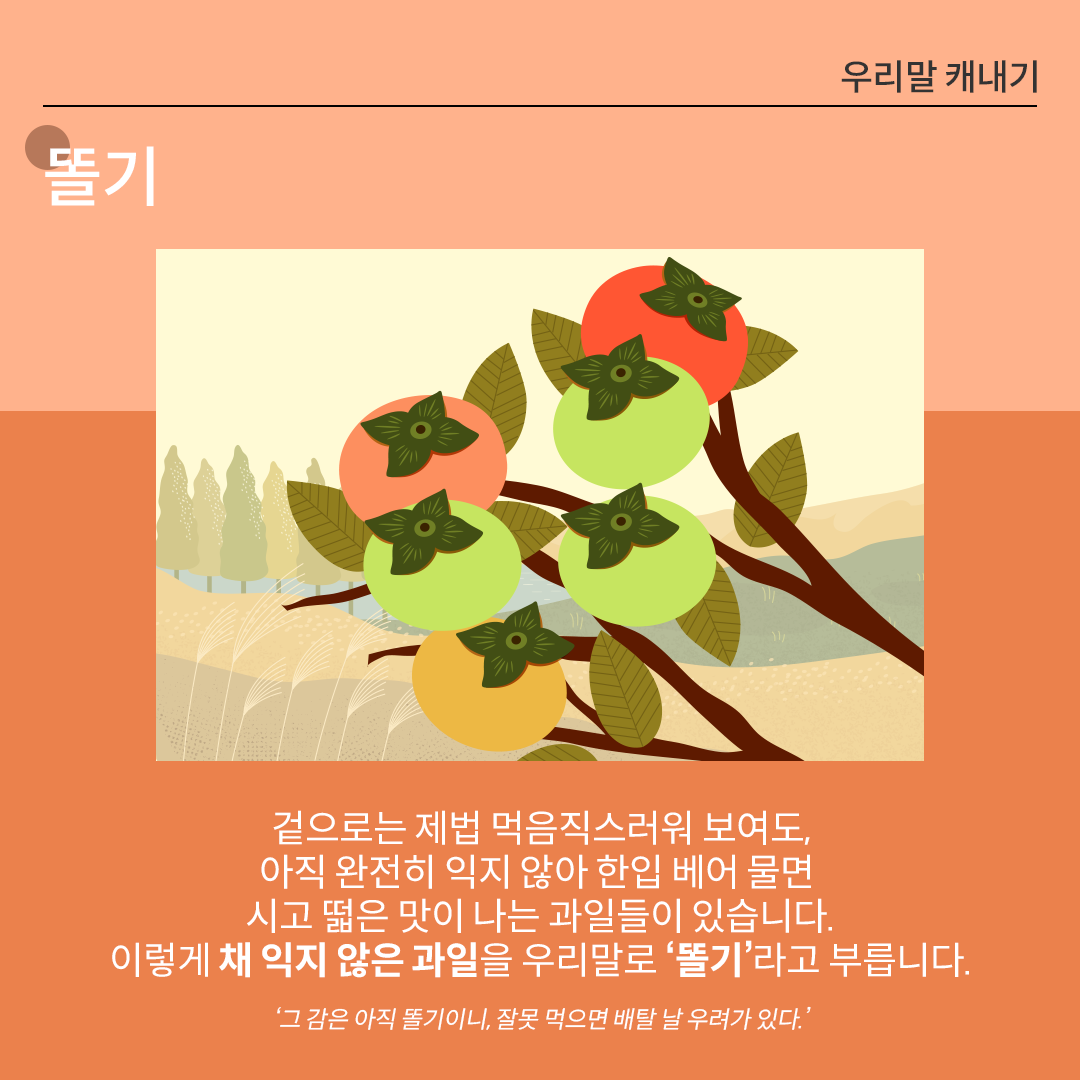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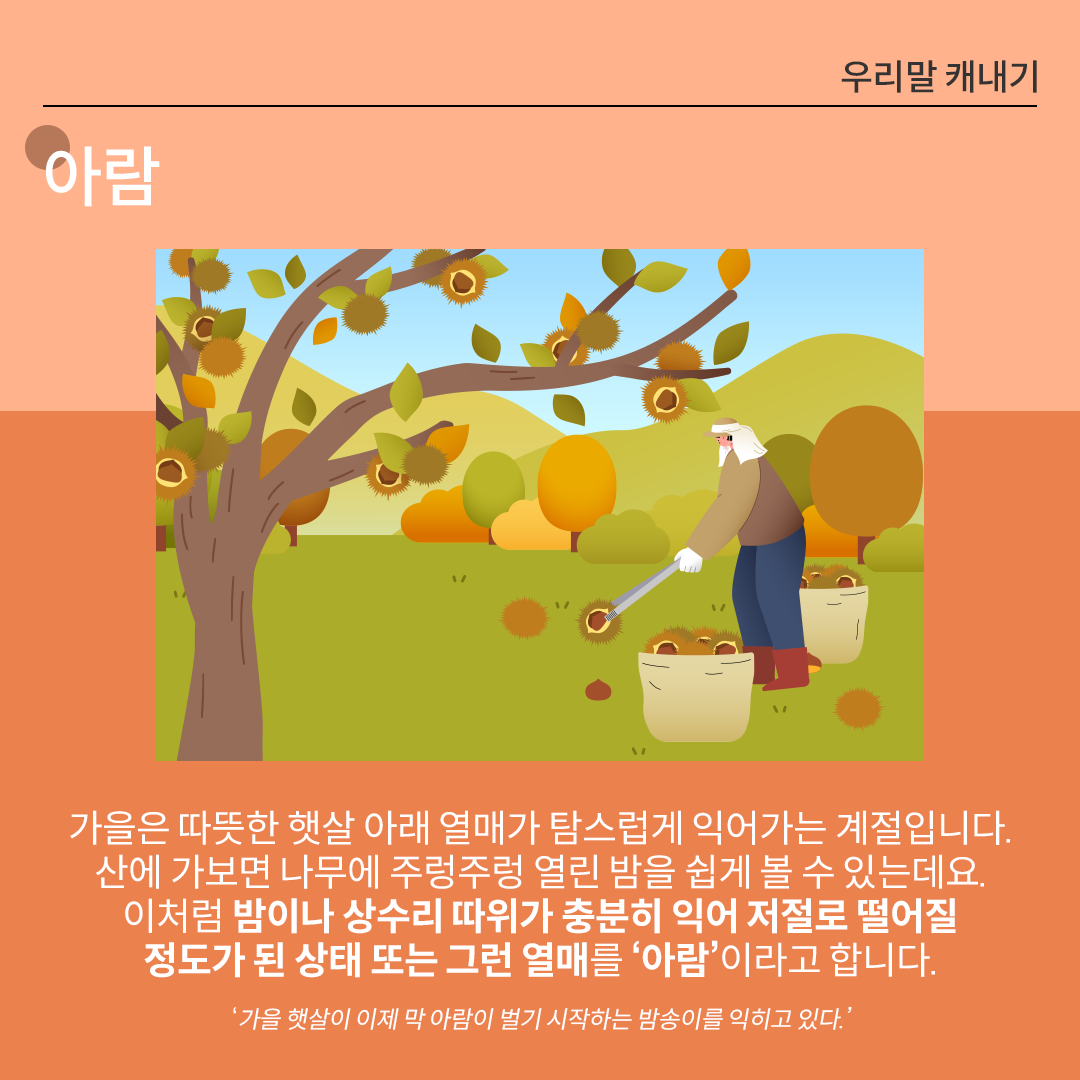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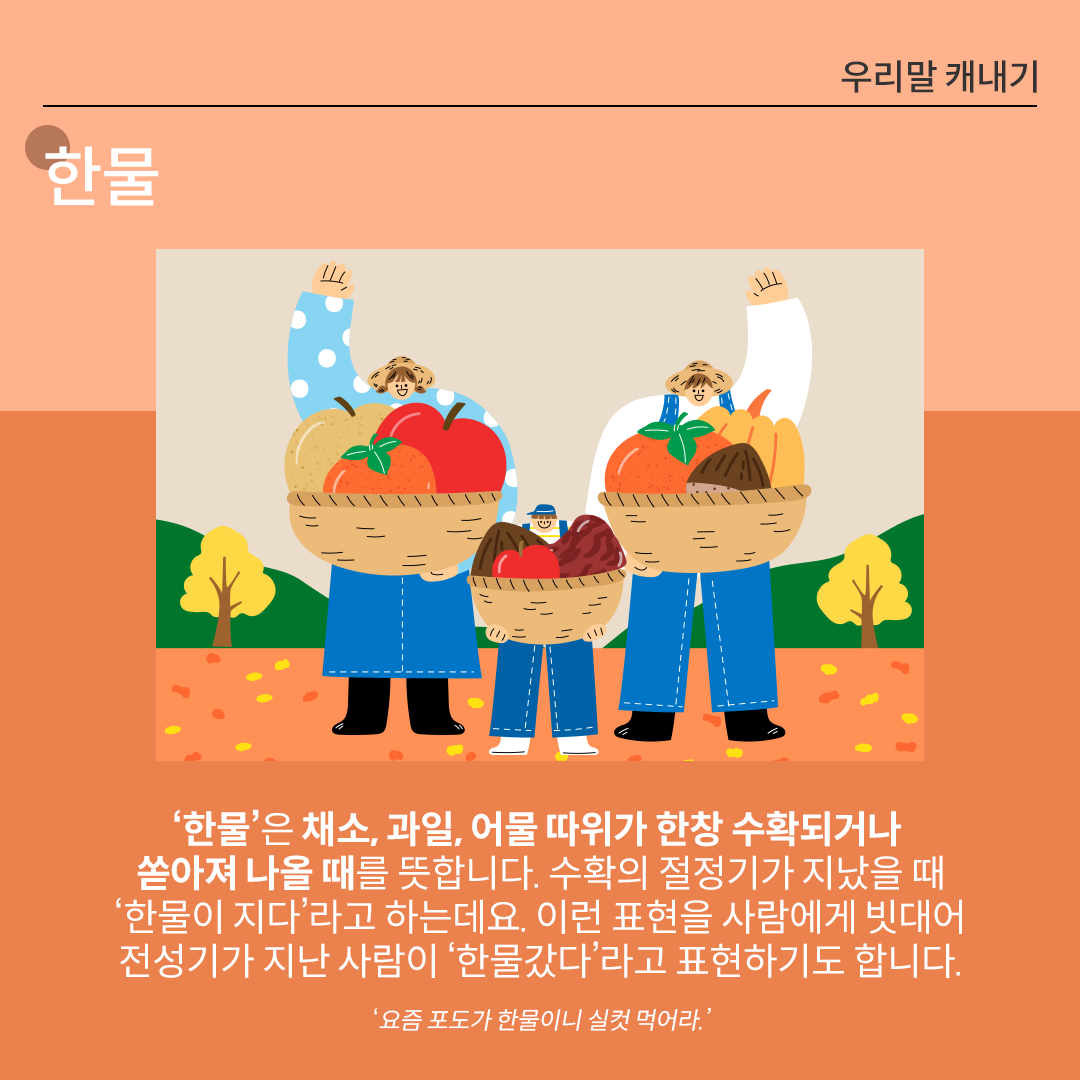
이번 호에서는 열매와 관련된 다양한 순우리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가을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우리말과 함께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보는 가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